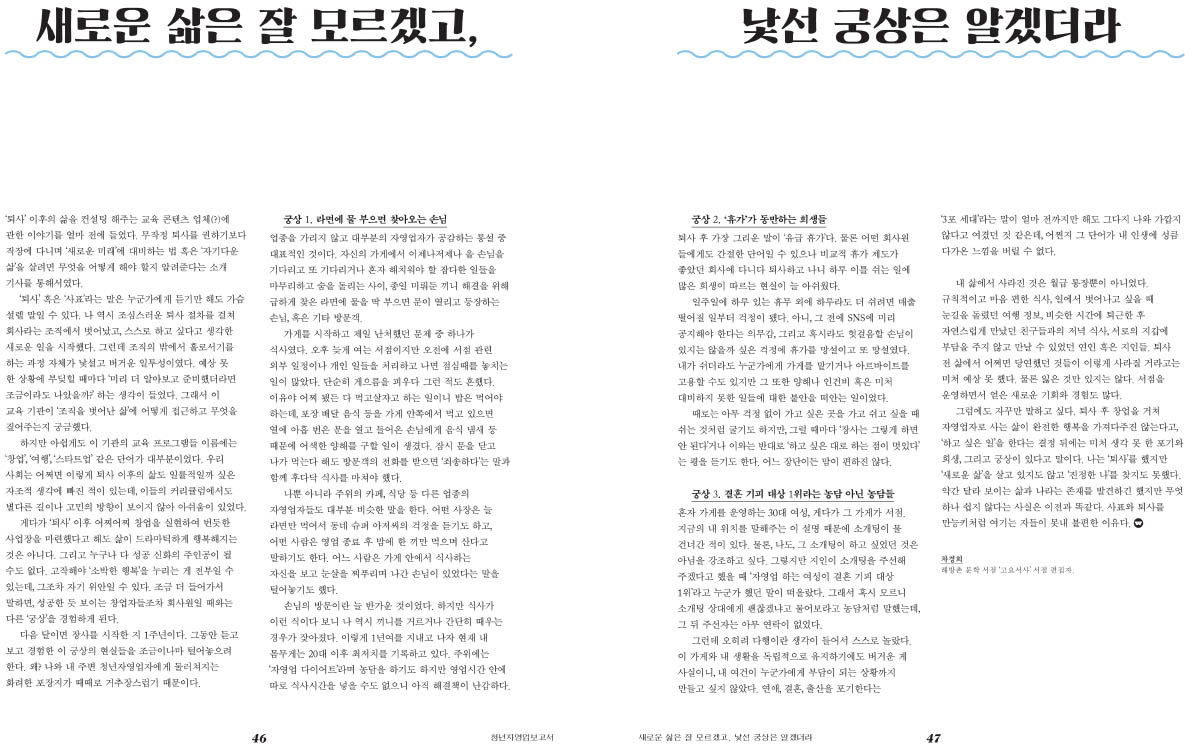
‘퇴사’ 이후의 삶을 컨설팅 해주는 교육 콘텐츠 업체(?)에 관한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었다. 무작정 퇴사를 권하기보다 직장에 다니며 ‘새로운 미래’에 대비하는 법 혹은 ‘자기다운 삶’을 살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준다는 소개 기사를 통해서였다.
‘퇴사’ 혹은 ‘사표’라는 말은 누군가에게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렐 말일 수 있다. 나 역시 조심스러운 퇴사 절차를 걸쳐 회사라는 조직에서 벗어났고, 스스로 하고 싶다고 생각한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그런데 조직의 밖에서 홀로서기를 하는 과정 자체가 낯설고 버거운 일투성이였다. 예상 못 한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미리 더 알아보고 준비했더라면 조금이라도 나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 교육 기관이 ‘조직을 벗어난 삶’에 어떻게 접근하고 무엇을 짚어주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들 이름에는 ‘창업’, ‘여행’, ‘스타트업’ 같은 단어가 대부분이었다. 우리 사회는 어쩌면 이렇게 퇴사 이후의 삶도 일률적일까 싶은 자조적 생각에 빠진 적이 있는데, 이들의 커리큘럼에서도 별다른 길이나 고민의 방향이 보이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다.
게다가 ‘퇴사’ 이후 어찌어찌 창업을 실현하여 번듯한 사업장을 마련했다고 해도 삶이 드라마틱하게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될 수도 없다. 고작해야 ‘소박한 행복’을 누리는 게 전부일 수 있는데, 그조차 자기 위안일 수 있다. 조금 더 들어가서 말하면, 성공한 듯 보이는 창업자들조차 회사원일 때와는 다른 ‘궁상’을 경험하게 된다.
다음 달이면 장사를 시작한 지 1주년이다. 그동안 듣고 보고 경험한 이 궁상의 현실들을 조금이나마 털어놓으려 한다. 왜? 나와 내 주변 청년자영업자에게 둘러쳐지는 화려한 포장지가 때때로 거추장스럽기 때문이다.
궁상 1. 라면에 물 부으면 찾아오는 손님
업종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공감하는 통설 중 대표적인 것이다. 자신의 가게에서 이제나저제나 올 손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거나 혼자 해치워야 할 잡다한 일들을 마무리하고 숨을 돌리는 사이, 종일 미뤄둔 끼니 해결을 위해 급하게 찾은 라면에 물을 딱 부으면 문이 열리고 등장하는 손님, 혹은 기타 방문객.
가게를 시작하고 제일 난처했던 문제 중 하나가 식사였다. 오후 늦게 여는 서점이지만 오전에 서점 관련 외부 일정이나 개인 일들을 처리하고 나면 점심때를 놓치는 일이 많았다. 단순히 게으름을 피우다 그런 적도 흔했다. 이유야 어찌 됐든 다 먹고살자고 하는 일이니 밥은 먹어야 하는데, 포장・배달 음식 등을 가게 안쪽에서 먹고 있으면 열에 아홉 번은 문을 열고 들어온 손님에게 음식 냄새 등 때문에 어색한 양해를 구할 일이 생겼다. 잠시 문을 닫고 나가 먹는다 해도 방문객의 전화를 받으면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후다닥 식사를 마쳐야 했다.
나뿐 아니라 주위의 카페, 식당 등 다른 업종의 자영업자들도 대부분 비슷한 말을 한다. 어떤 사장은 늘 라면만 먹어서 동네 슈퍼 아저씨의 걱정을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영업 종료 후 밤에 한 끼만 먹으며 산다고 말하기도 한다. 어느 사람은 가게 안에서 식사하는 자신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며 나간 손님이 있었다는 말을 털어놓기도 했다.
손님의 방문이란 늘 반가운 것이었다. 하지만 식사가 이런 식이다 보니 나 역시 끼니를 거르거나 간단히 때우는 경우가 잦아졌다. 이렇게 1년여를 지내고 나자 현재 내 몸무게는 20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주위에는 ‘자영업 다이어트’라며 농담을 하기도 하지만 영업시간 안에 따로 식사시간을 넣을 수도 없으니 아직 해결책이 난감하다.
궁상 2. ‘휴가’가 동반하는 희생들
퇴사 후 가장 그리운 말이 ‘유급 휴가’다. 물론 어떤 회사원 들에게도 간절한 단어일 수 있으나 비교적 휴가 제도가 좋았던 회사에 다니다 퇴사하고 나니 하루 이틀 쉬는 일에 많은 희생이 따르는 현실이 늘 아쉬웠다.
일주일에 하루 있는 휴무 외에 하루라도 더 쉬려면 매출 떨어질 일부터 걱정이 됐다. 아니, 그 전에 SNS에 미리 공지해야 한다는 의무감, 그리고 혹시라도 헛걸음할 손님이 있지는 않을까 싶은 걱정에 휴가를 망설이고 또 망설였다. 내가 쉬더라도 누군가에게 가게를 맡기거나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수도 있지만 그 또한 양해나 인건비 혹은 미처 대비하지 못한 일들에 대한 불안을 떠안는 일이었다.
때로는 아무 걱정 없이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쉬고 싶을 때
쉬는 것처럼 굴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장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거나 이와는 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점이 멋있다’ 는 평을 듣기도 한다. 어느 장단이든 맘이 편하진 않다.
궁상 3. 결혼 기피 대상 1위라는 농담 아닌 농담들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30대 여성, 게다가 그 가게가 서점. 지금의 내 위치를 말해주는 이 설명 때문에 소개팅이 물 건너간 적이 있다. 물론, 나도, 그 소개팅이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 그렇지만 지인이 소개팅을 주선해
주겠다고 했을 때 ‘자영업 하는 여성이 결혼 기피 대상 1위’라고 누군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 소개팅 상대에게 괜찮겠냐고 물어보라고 농담처럼 말했는데, 그 뒤 주선자는 아무 연락이 없었다.
그런데 오히려 다행이란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놀랐다. 이 가게와 내 생활을 독립적으로 유지하기에도 버거운 게 사실이니, 내 여건이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까지 만들고 싶지 않았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3포 세대’라는 말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다지 나와 가깝지 않다고 여겼던 것 같은데, 어쩐지 그 단어가 내 인생에 성큼 다가온 느낌을 버릴 수 없다.
내 삶에서 사라진 것은 월급 통장뿐이 아니었다. 규칙적이고 마음 편한 식사, 일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눈길을 돌렸던 여행 정보, 비슷한 시간에 퇴근한 후 자연스럽게 만났던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 서로의 지갑에 부담을 주지 않고 만날 수 있었던 연인 혹은 지인들. 퇴사 전 삶에서 어쩌면 당연했던 것들이 이렇게 사라질 거라고는 미처 예상 못 했다. 물론 잃은 것만 있지는 않다. 서점을 운영하면서 얻은 새로운 기회와 경험도 많다.
그럼에도 자꾸만 말하고 싶다. 퇴사 후 창업을 거쳐 자영업자로 사는 삶이 완전한 행복을 가져다주진 않는다고,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결정 뒤에는 미처 생각 못 한 포기와 희생, 그리고 궁상이 있다고 말이다. 나는 ‘퇴사’를 했지만 ‘새로운 삶’을 살고 있지도 않고 ‘진정한 나’를 찾지도 못했다. 약간 달라 보이는 삶과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긴 했지만 무엇 하나 쉽지 않다는 사실은 이전과 똑같다. 사표와 퇴사를 만능키처럼 여기는 자들이 못내 불편한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