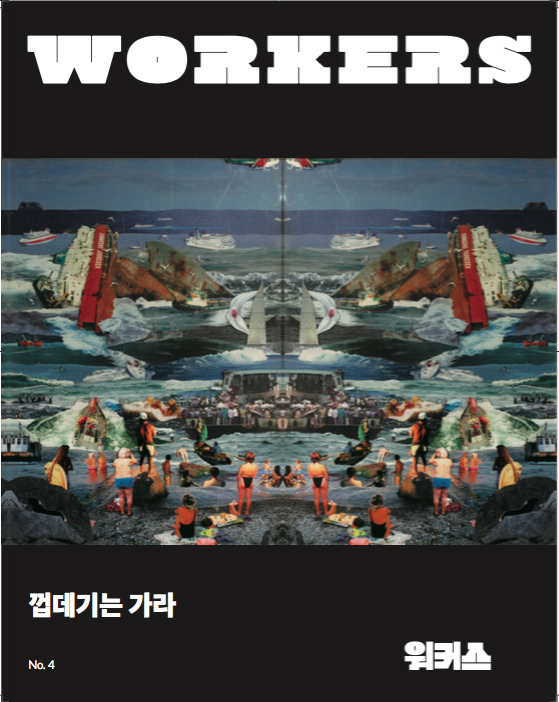
홍석만 편집장
역사는 언제 후퇴할까? 우파 집권으로 보수적인 정책이 강행된 우경화 때문일까? 아니다. 역사의 교훈은 우파보다 좌파에 더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알다시피 독일 나치는 이름 그대로 국가사회주의당이었고 좌파 사상으로 출발했다.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파시스트당도 초기에는 국가사회주의와 생디깔리즘이 결합된 반제국주의 사상을 가긴 급진적인 정당이었다. 우리도 이승만 이후 이어진 장기 군부 독재 정치의 비극은 남로당 출신 박정희로부터 시작됐다.
이제는 만악의 근원이 된 ‘신자유주의’도 보수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 진영에서부터 확대됐다. 영국에서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현한 것은 대처를 이어 집권한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부였다. 유럽 전체에 신자유주의 광풍이 몰아친 1990년대는 유럽 각국에서 사민당이 가장 많이 집권한 때이기도 하다. 한국의 신자유주의도 1997년 외환 위기에 이어 집권한 민주 세력 김대중 정부(좌파는 아니지만)에서 본격화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완성됐다. 이처럼 좌파 (정당)의 우경화 또는 타락은 독재와 파시즘의 기초가 됐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비극적 결말을 초래해 왔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정치의 우향우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그것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편향된 역사 교과서를 채택하고, 반발하는 정치인을 찍어 누르고, 대통령 사진을 ‘존영’이라 부른 것 때문은 아니다. 더민주당이 북한 궤멸론을 말하고 노조의 사회 연대 자제를 요구하는 김종인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모셔 온 것 때문도 아니다. 한상진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부로 추앙한다고 해서도, 더민주당을 운동권 정당으로 규정하고 오른쪽으로 달려가서도 아니다. 각 당의 공천이 계파 간 자리싸움으로 이합집산을 거듭한 때문도 아니다. 이런 일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말로 우려스러운 것은 진보 정당이다.
진보 진영이 의회에 들어간 이후 역사상 가장 많은 진보 정당이 우후죽순 생겨났지만 각자의 목소리나 정체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정의당은 지형적 정세의 이점만을 노리고 더민주당과의 후보 연합에 목을 매고 있다. 그래, 선거 연합은 어차피 전술이다.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강령은 어떤가? 정의당은 강령을 좌파 정당이라고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경제 민주화, 사회적 경제, 복지 국가론의 재판으로 버무렸다. 이것이 더민주당의 그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번 선거에서 두 정당은 사실상 아무런 정책적 차이가 없다.
영국에서는 과거 신자유주의를 주도한 노동당 내부의 반성으로 사회주의자 제레미 코빈이 당수가 되고, 미국에서도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샌더스가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선전하고 있다. 유럽 경제 위기 국가에서는 좌파 정당이 기세를 올리며 전진하고 있다. 이미 사회주의 좌파 정당이 뿌리를 내린 남미에서는 우파의 정치 공세 속에서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다. 자본주의 위기 상황에서 좌파의 정치적 진출은 역사적으로 보면 당연하며, 전 세계 곳곳에서 좌파 정당의 힘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진보 정당은 대중성, 집권 가능성 혹은 의회 의석에 연연하며 우향우를 거듭한 결과 좌파의 정치는 사라졌고, 사분오열과 각개 약진을 거듭하고 있다. 망아지가 날뛰는 것은 죄고 있던 고삐가 느슨해졌기 때문이다. 좌파의 목소리가 크고 좌파의 정치가 담대할수록 우파의 날뜀은 잦아들게 된다. 만약 이 총선이 우리 역사에서 또 다른 비극의 출발점이 된다면, 다름 아닌 좌파의 책임으로 남게 될 것이다.
워커스 4호 데스크 칼럼 (2016.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