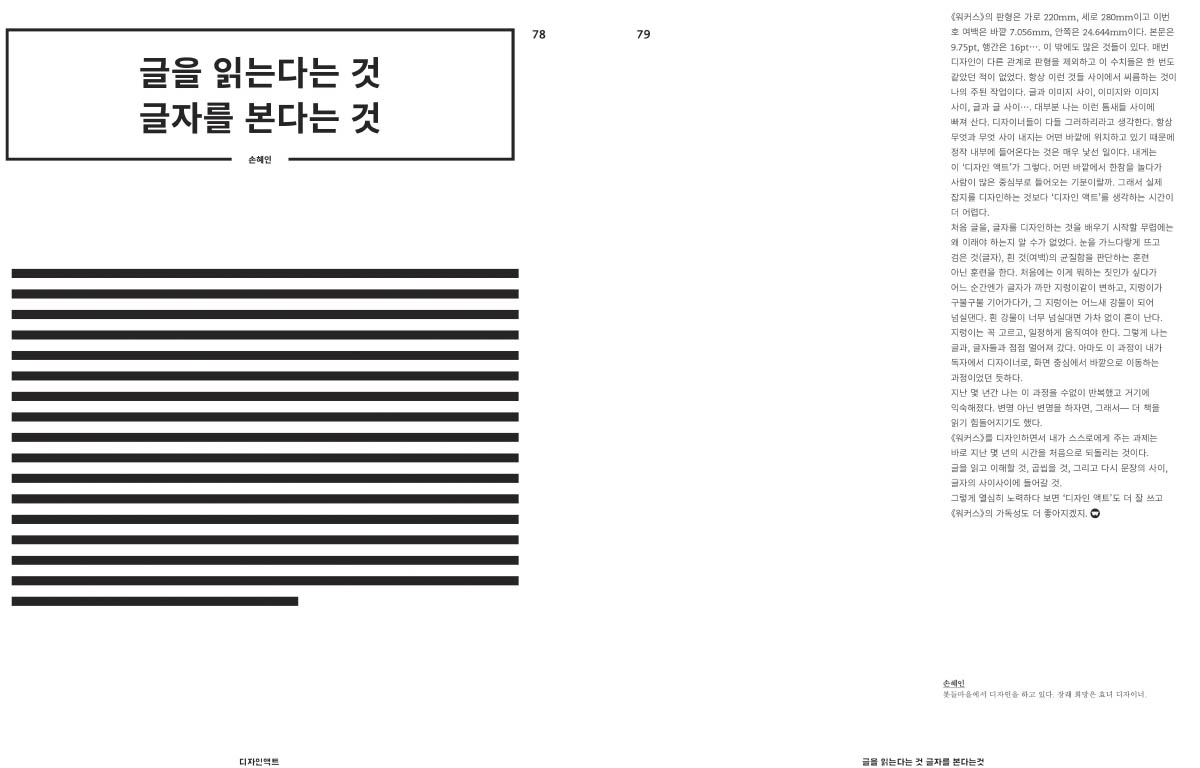
디자인/ 손혜인
《워커스》의 판형은 가로 220mm, 세로 280mm이고 이번 호 여백은 바깥 7.056mm, 안쪽은 24.644mm이다. 본문은 9.75pt, 행간은 16pt…. 이 밖에도 많은 것들이 있다. 매번 디자인이 다른 관계로 판형을 제외하고 이 수치들은 한 번도 같았던 적이 없었다. 항상 이런 것들 사이에서 씨름하는 것이 나의 주된 작업이다. 글과 이미지 사이,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 글과 글 사이…. 대부분 나는 이런 틈새들 사이에 빠져 산다. 디자이너들이 다들 그러하리라고 생각한다. 항상 무엇과 무엇 사이 내지는 어떤 바깥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내부에 들어온다는 것은 매우 낯선 일이다. 내게는 이 ‘디자인 액트’가 그렇다. 어떤 바깥에서 한참을 놀다가 사람이 많은 중심부로 들어오는 기분이랄까. 그래서 실제 잡지를 디자인하는 것보다 ‘디자인 액트’를 생각하는 시간이 더 어렵다.
처음 글을, 글자를 디자인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할 무렵에는 왜 이래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눈을 가느다랗게 뜨고 검은 것(글자), 흰 것(여백)의 균질함을 판단하는 훈련 아닌 훈련을 한다. 처음에는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다가 어느 순간엔가 글자가 까만 지렁이같이 변하고, 지렁이가 구불구불 기어가다가, 그 지렁이는 어느새 강물이 되어 넘실댄다. 흰 강물이 너무 넘실대면 가차 없이 혼이 난다. 지렁이는 꼭 고르고, 일정하게 움직여야 한다. 그렇게 나는 글과, 글자들과 점점 멀어져 갔다. 아마도 이 과정이 내가 독자에서 디자이너로, 화면 중심에서 바깥으로 이동하는 과정이었던 듯하다.
지난 몇 년간 나는 이 과정을 수없이 반복했고 거기에 익숙해졌다.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그래서— 더 책을 읽기 힘들어지기도 했다.
《워커스》를 디자인하면서 내가 스스로에게 주는 과제는 바로 지난 몇 년의 시간을 처음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글을 읽고 이해할 것, 곱씹을 것, 그리고 다시 문장의 사이, 글자의 사이사이에 들어갈 것.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디자인 액트’도 더 잘 쓰고 《워커스》의 가독성도 더 좋아지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