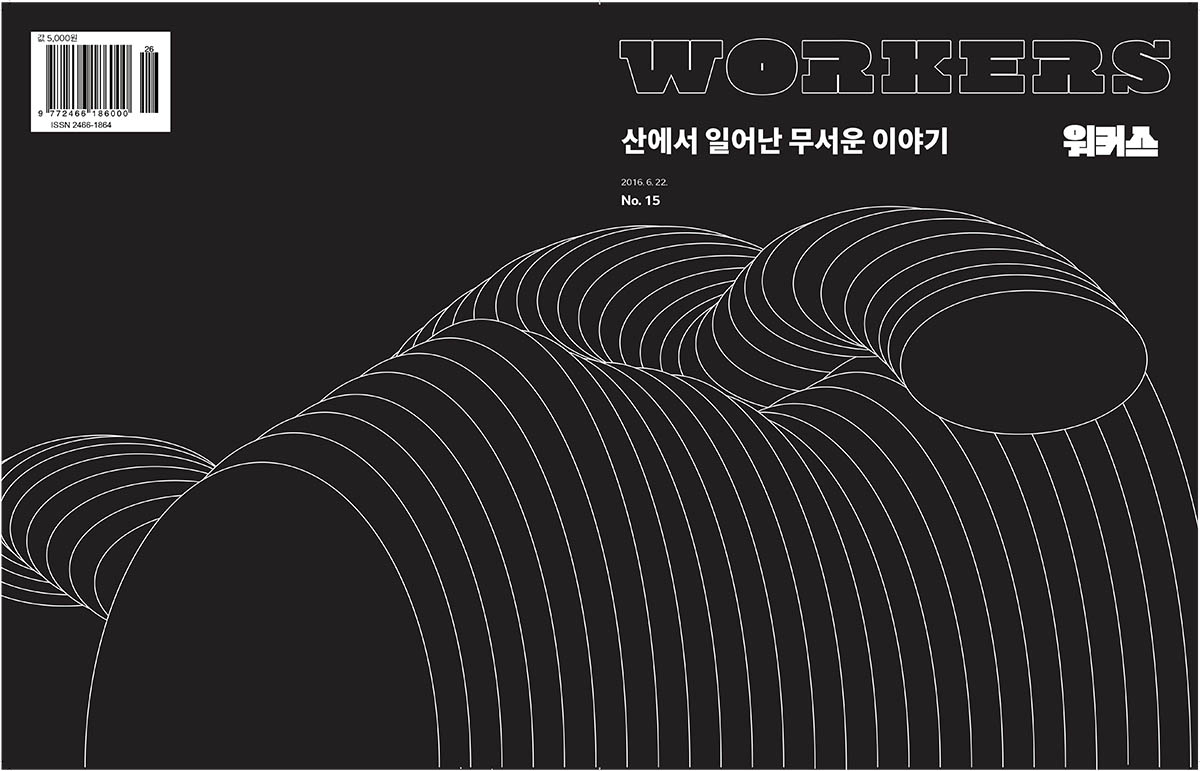
워커스 15호 표지
홍석만 편집장
남양주 전철 공사장 폭발 사고, 구의역 안전문 사고. 요즘 우리는 사람 사는 얘기가 아니라 죽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다. 여기에 강남역 여성 혐오 살인, 사패산, 수락산 여성 살인 사건까지, 최근 한 달 내내 비정규직이라서, 여성이라서 죽어야 하는 현실을 지켜봤다. 이제 죽음의 이유에 ‘가난’을 하나 더 추가해야 한다.
《워커스》 15호에선 시골에서 장애인 여동생과 살며 산불 감시원과 같은 계절직 노동을 전전하다 생활고에 시달려 여동생을 살해하고 동반 자살하려 한 노동자의 사연을 다뤘다.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일자리, 장애 그리고 빈곤은 자신은 물론 가족의 삶까지도 뺏고 마는 것이다.
지난 6월 3일에는 26세 청년 이 모 씨가 아버지와 함께 살던 SH 임대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 씨의 아버지는 중증 장애인으로 기초 생활 수급비와 장애인 연금으로 매월 78만 원가량 받고 있었다. 이 씨는 2014년 10월부터 아버지의 집에 함께 살았지만 전입 신고를 할 수 없었다. 전입 신고를 하면 아버지가 받는 기초 생활 수급비가 줄어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해 3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 씨는 장례를 치르고 3주 뒤에 전입 신고를 했다. 하지만 SH공사는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이 씨의 전입 신고가 안 돼 있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재계약 불가’를 통보하고 집을 나가라고 했다. 오갈 데 없었던 이 씨는 계속 그 집에서 살았지만, SH공사는 올해 4월 법원을 통해 강제 퇴거를 요청했다. 법원은 5월 28일 이 씨에게 자진 퇴거를 명했고, 6일 후 이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젊은이가 전입 신고도 못 하고 버텼던 이유는 근로 능력 평가와 부양 의무자 제도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거나, 소득이 있는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수급권이 제한되거나 박탈된다. 이 씨는 공황 장애를 심하게 앓고 있었고 아르바이트조차 하기 어려웠지만 근로 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기는 더 어려웠다. 결국 기초 생활 수급권자인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와 같이 살게 됐지만 수급비가 줄어들까 봐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다.
식당일을 하다 실직한 어머니와 병든 두 딸,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가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번개탄을 피워 자살했다. 국가도, 자치단체도, 사회도 외면했던 그들의 삶을 반추하며 그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했다. ‘송파 세 모녀 법’이라 불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7월로 꼭 1년이 된다. 하지만 복지 사각 지대 주범으로 불리는 부양 의무자 기준, 근로 능력 평가, 추정 소득 문제는 여전하다. 최저 생계비 이하인데도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한 사람은 117만 명에 달했다. ‘송파 세 모녀 법’에도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로 수급자가 된 이들은 약 12만 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 부정 수급이 빈발할 것이라며, 이 제도가 존속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부정 수급의 90%는 개인이 아니라 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다. 부양 의무자 문제는 정치권의 외면 속에서 방치되고 있다. 지난 4.13 총선에서 참여연대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원내 주요 정당의 복지 공약을 평가한 결과, 정의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부정 수급뿐 아니라 다른 어떤 문제로라도 응당 받아야 할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사회 공동체의 원리이다. 빈곤 때문에 삶을 포기해야 하는 국가라면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





